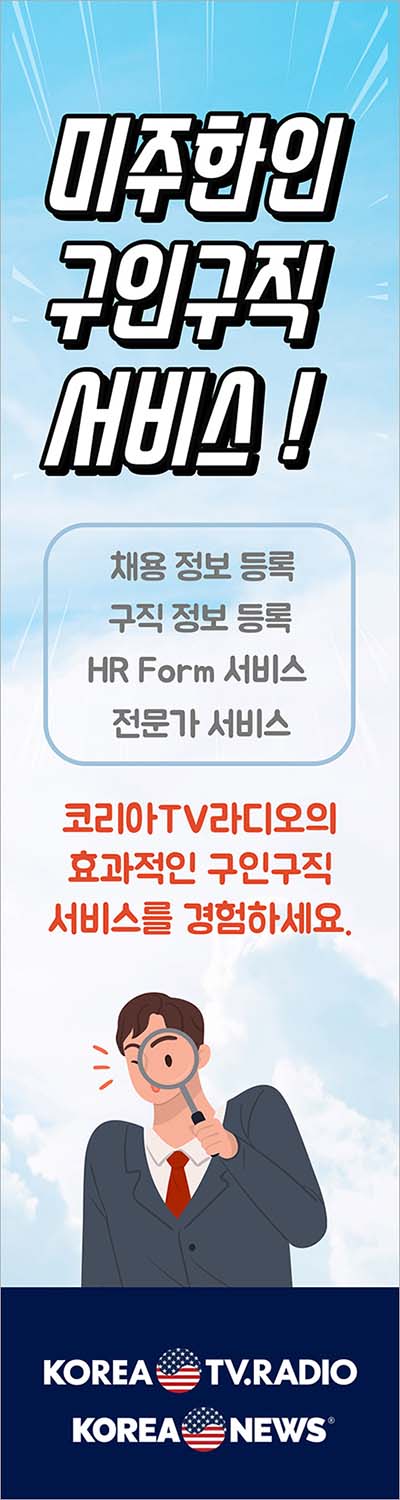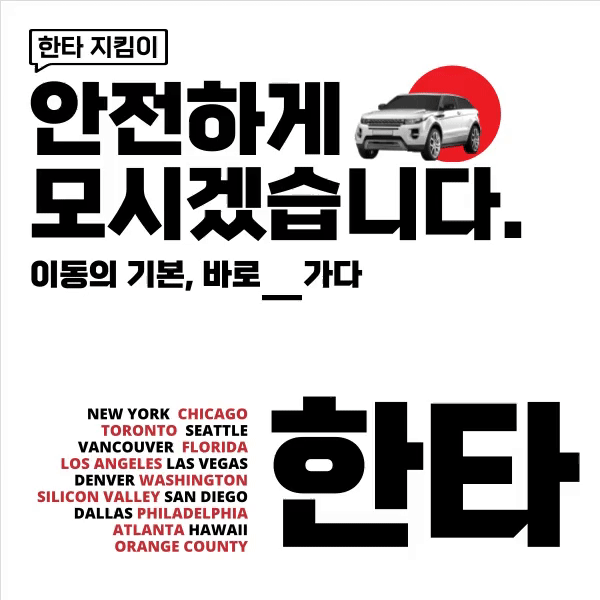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애리조나주의 고교 졸업반에 다니는 케이든 에번스(18)는 대학 진학 대신 건설 현장 인턴을 택했다. 화려한 테크 기업 대신 흙먼지가 날리는 현장을 고른 이유는 단순했다. 그곳의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이 설계를 도울 순 있어도 고장 난 엔진을 뜯어고치는 건 결국 사람의 손"이라고 단언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에서 용접공으로 전직한 태비 더글러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는 "경영진이 비용 절감을 위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상실은 현실적인 공포"라며 "다양한 기술을 배워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번스와 더글러스처럼 미국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적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는 AI가 화이트칼라의 직무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직업 대전환(Job Transformation·JX)'의 단면이자 불완전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청년들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들이 '블루칼라로의 대이동'을 결심한 배경은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AI 혁명과 제조업 리쇼어링, 고학력 인플레이션 붕괴가 맞물린 구조적 지각변동으로 분석한다.
우선 AI의 충격이 집중된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전 세계 노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레벨리오랩스에 따르면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 사이 화이트칼라 신규 채용 공고는 12.7% 감소했다. 특히 핵심 직무인 SW 개발자와 비즈니스 분석가의 감소폭은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아마존, UP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기업들이 올해 단행한 수만 명 규모의 감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AI 도구를 통해 조직 효율을 높이려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그러나 블루칼라 시장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지난 30년간 미국이 금융과 SW 등 서비스업에 치중하며 기술 교육을 등한시한 대가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까지 겹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희소성은 곧 임금 급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채용 플랫폼 블루리크루트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체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3.9%에 그쳤지만, 건설 현장 일반 노동자(16%), 자동차 정비 기술자(10%), 전기 기술자(5%)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부 냉난방공조(HVAC) 기술자의 상위 10% 연봉은 9만달러를 넘어서며 인문계열 대졸자의 소득을 상회한다. 이러한 '블루칼라 르네상스'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역설적이게도 AI 산업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이다. 인력 서비스 업체인 켈리서비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현장의 전기기사와 관리자 임금은 이전보다 평균 25~30% 뛰었다. 연봉 10만~20만달러는 흔해졌고, 일부 숙련공은 22만달러 이상을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블루칼라가 주목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AI가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생성형 AI가 코드를 짜고 보고서를 쓸 수는 있어도 누수가 발생한 파이프를 조이거나 고압 전선을 교체하는 비정형 육체노동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조버가 올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18~20세)의 77%는 "자동화하기 어려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