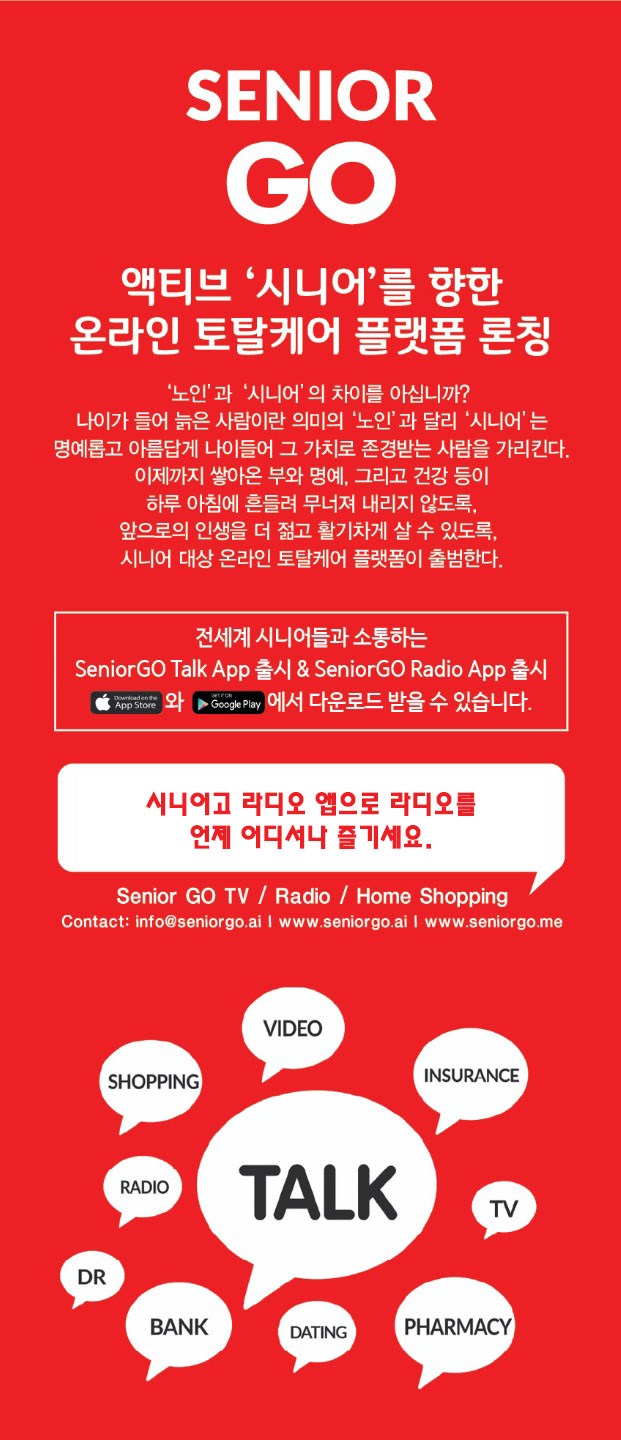-

한국정치 [단독] 홍진기는 왜 시위대를 쏘았나?
1960년 4월 19일, 서울의 봄은 피로 물들었다. 경무대 앞은 학생들의 함성과 최루탄 연기, 그리고 곧 총알 소리로 뒤덮였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이승만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돌진했다. 경찰의 방패벽은 이미 무너졌고, 공기 중에는 죽음의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역사에 피의 기록을 새겼다. “장관님, 더 이상 못 막습니다. 시위대가 경무대를 향해 밀려오고 있어요. 발포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 경찰국장 유충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 내무부 장관 홍진기(洪璡基)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갑게 떨어지는 한마디. “사태가 위급하면 발포하시오.” 그 한마디가 18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경무대 앞에서만 21명 사망, 172명 부상. 전국으로는 사망 186명, 부상 6천여 명. 그날 이후 한국 현대사는 영원히 갈라졌다. 홍진기는 왜 그 명령을 내렸을까? 그 물음은 65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 명령은 단순한 관료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중앙일보를 낳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끌고간 ‘보도 DNA’가 되었다. 3.15 부정선거, 그리고 불타는 봄 모든 것은 1960년 3월 15일
- Steven Choi
- 2025-11-25 18:43
-

한국정치 [단독] 홍정도는 왜 노무현의 심장을 겨눴나
| [단독] 홍정도는 왜 노무현의 심장을 겨눴나 ‘노무현 죽이기’ 프레임의 진짜 설계자는 누구였나 —스탠퍼드발(發) 취재, 데스크의 익명 지시, 그리고 한국 정치의 2009년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문장이 진부하게 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이 언론의 ‘프레임’에 의해서 서서히 밀려날 때, 그 문장은 다시 칼날이 된다. 2009년 봄, 팰로 앨토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몇 편의 기사와 몇 줄의 캡션은 여론을 바꾸었고, 그 여론은 다시 한 사람을 벼랑으로 몰았다. 이 르포는 그 봄의 동선을 복원한다. 누가, 무엇을, 왜 겨눴는지—그리고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1. 보수언론 정체성 ‘이탈’과 ‘복귀’ 사이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 부터 중앙일보는 보수 선명성 시비에 시달렸다. 노무현 정부 초기 중앙일보는 전통적 보수 3대 일간(이른바‘조중동’)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정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노무현 정권과 보조를 맞추면서 친진보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 이런 중앙일보의 변화에 보수 독자들은 의아해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 홍라희 여사의 남동생으로 친기업, 친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우파 중도 매체인데, 노무현 정권 들어서 논조
- Steven Choi
- 2025-11-21 22:05